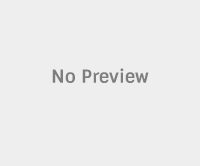당신을 추억함… (1)
가끔씩 특별해지는
당신의 이름이 가끔 버겁기는 하나
가을에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사소한 사치 하나로
지지부진한 나의 일상을 위로해본다…
[0] 고백
언제였던가.. (웃. 벌써 7년전 1학년 때군 –;)
흐느적거리는 바 한 구석… 흐물거리는 불빛아래서…
그녀는 고백했다.
처음 엠티에서 만난 날부터 나를 찍었다구…
나도 덩달아 고백했다.
난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의 운명을 짐작했다고… –:
씨바.. 그리곤 조금 있다 후회했다. -_-;;
그녀가 찍은 이유나 듣고 나서 할걸…
…………
…………
그녀가 날 찍은 이유는
단지 ‘라면 잘 끓인다’ 는 이유 하나였다.
머슴으로 키우면 잘 써먹겠다고… -_-::
세상은 참말로 아이러니컬하다. -o-
[1] 밥
그녀는 나만큼 밥을 잘 먹었다.
( 이스를 모르는 사람은 별 감흥이 없을 지 모르나
아는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 할 거다… -_- )
난 세상에서 그녀만큼 밥 잘 먹는 여자를 본 적이 없다.
그렇다. 라면 잘 끓이는 걸로 날 찍었을 때부터 눈치를 깠어야 했다.
한 때 잘 나가는 과외 선생이였던 나도
온통 밥값으로 과외비를 날렸다.
무서웠다. -_-
밥값으로 허덕이는 생활고 끝에
몇일동안만이라도 그녀를 피하고자 결심한 적이 있다.
(하.. 안 될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_-;;;)
며칠 잘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삐삐가 왔다…
음성확인.
– 야~! 너 요새 나 왜 피해?
엉?
밥값이 너무 많이드냐?
(곰탱이가 눈치는 진짜 빠르다. –;)
내가 밥 살게. 나와랏. 지금 니네 학교 앞.
난 너무 순진했다. 빙신같이 그걸 믿었다.
나갔다.
그녀는 진짜 밥만 샀다.
해물전에, 우렁된장찌개에, 고갈비에…
양념치킨에… 소주 5병에 맥주 3000…
게다가 베스킨 라빈스 아수크림 후식까지…
집에 갈 때 구걸구걸해서
버스비 타서 갔다.
흓..물론, 몇 일동안 차비 없어서 학교도 못 갔다. ㅜ.ㅜ
그 날부터 그녀의 빨간 날은 더더욱 조심했다.
[2] 탕수육
유난히 탕슉을 좋아했던 그녀…
한창 요리에 심취해 있던 나…
그녀를 위해 탕슉을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특별히 배운 요리솜씨를 뽐내기 위해
그녀만 있던 일요일 오후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바삭바삭 노릇노릇 2번씩 아주 잘 튀겨냈다.
이제 소스만 남았다.
감자가루를 잘 게어서 끓이고
야채를 넣어 만들긴 만들었는데…
제 맛이 안 나온다.
그녀 흥분한다.
– 비~ㅇ신 그것도 모르냐?
야채 안 볶아서 넣었지?
– 엉
(왜 볶아서 넣어? 너 돌았지? ^^? 그 땐 그렇게 생각했다. -_- )
– 그러니깐 제 맛이 안나지…
우쒸..내가 보여줄게…
헉…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_-
그녀 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야채를 볶기 시작한다.
(식용유도 아니고…)
맘에 안 드는지 올리브유도 넣는다.
왕창 -_-
…올리브유가 사람몸에 좋다는 얘길하면서.. —
그리고 감자가루 끓인데다가 넣는다.
후~ ( __)
(나중에 안거지만 야채를 살짝 볶아줘야 하는 건 사실이다.
대신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스..지금은 프로급이다. ^^v )
탕슉에 그 특별한(!) 소스를 붓고 한 번 먹어보라 한다.
한 손엔 포크를… 한 손엔 아까 야채썰던 부엌칼을 들고…
– 맛있지?
– 엉.. 햐~~ 정말 맛있다. 능청능청… ( __)
(그렇다. 살기 위해선 이까짓 거짓말 쯤 1000번이고 할 수 있다. –; )
– 야 아까 니가 만든 소스 아까우니깐.
탕슉 하나 집어 먹구 아까 것두 한 번 숟가락으로 떠 먹구 구래…
– 야~! 아냐..아니야… 건 안 먹을래.
그럼 이 요리 맛을 제대로 못 느끼잖아…
(진짜 무서웠다. 정말 피하고 싶었다.. 후 -_-)
– 그럴까?
그럼.. 탕슉 다 먹고 밥 말아 먹어…
그 날 밤 우리 집 변기 막힐 뻔 했다. ㅜ.ㅜ
그 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아직도 내 장엔 그 올리브유가 끼어있는 듯 하다.
[3] 약
그녀는 뚱뚱했다.
그렇다.
난 좀 독특하게 뚱뚱한 여자가 좋았다. 지금도 좋다;;
보는 이로 하여금 푸근함과 넉넉함을 느끼게 해 줄 수 있고,
두 팔로 안을 땐 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했다. -_-;;
그녀는 자기 몸매에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내 몸매엔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 –;;
– 쓰바..
넌 나보다 더 많이 먹는데 왜 먹어도 살이 안 쪄???
(디랄~ 넌 나보다 배는 먹잖아…)
– 나두 몰라 –;
체질인가봐…
– 체질? 웃기시네…
체질 좋아하네…
웃으면서 안 먹으니깐 그래…
좀 즐거운 맘으로 먹어봣!!!
– 어 그래…
그 때부터 난 먹을 때 항상 웃는 버릇이 생겼다.
(원래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_-)
가을이였다.
어느 우울한 오후.. 커피숍에서 그녀가 나에게 약을 내민다.
– 걱정돼… 너 어디 아픈 거 같아서…
– 왜?
– 맨날 그렇게 말라서 어따 쓰냐?
– 하핫.. 멀.. 그래도 힘은 돌쇠잖아… 방긋
(걱정마. 힘이 남아돌아. 밤일 캡이야.. 허억 -_-)
– 안 되겠다… 이것 좀 먹어봐바…
그녀가 내민 것은 바로…
‘회충약’ 이었다.
쪽팔려서 죽고 싶었다.
옆에 테이블 사람들…
우리 대화 다 들었었는지 뒤집어 진다…
에휴 저것들 모두 다 썅~~
이후로…
살면서 황당했던 사건을 얘기하라면 보통 이 때를 꼽는다. -_-
후. 그 때는 회충약 선전도 안 하던 때였는데… -_-;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