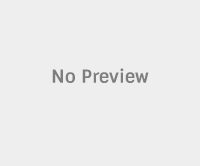또 1년이 내게 주어진다.
학교 다녔을때 엄마가 새로운 공책을
내손에 쥐어준 것처럼…
그런 새공책같은 1년이 2003년이란 이름을 달고
내게 쥐어졌다.
새거는 늘 조금은 설렌다.
언젠가 또 헤져서 너덜너덜해지고 말텐데…
전에 쓰던 공책은 다쓴부분은 찢어버리거나
또 어떤부분은 가위로 예쁘게 잘라서
스크랩해두곤 했었다.
그렇게…지난해도 기억속에 정리할수 있다면
지금의 시작이 새공책보다 더 부담스럽진 않을텐데…
찢어버리고, 스크랩하고, 테이프를 붙여두고
다시 남은 여분을 활용하고…그랬다면…
지난 내모습이 적어도 아깝지는 않았겠지.
그렇게 또 새공책의 한장을 써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