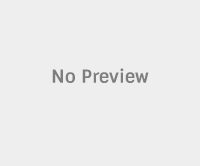떡배는 어디로 갔을까?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은 첫경험이다.
노동자이건 판사이건 성직자이건 도둑이건 회사이건…
70세의 노인은 그 70세의 나이에 겪는 일들이 모두 첫경험이고
7세의 어린아이는 그 7세의 나이에 겪는 일들이 모두 첫경험이다.
그 사람들은 다 서툴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첫경험은 쓰리고 아프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아직 서툰 사람들이다.
[서툰 사람들]에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바쁜 도시생활에 길들여지고
기본적인 가족 간의 사랑도 부족한 우리는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느끼지 못 할 만큼 메말라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주민등록 번호 같은 숫자나
집주소 같은 반복적인 명사로만 표현하는 것이 더 능숙한
서로에게 어색하고 사람에 서툰 사람들이다…
상처 받기를 싫어하는 만큼, 나 자신을 생각해줘야 하는 만큼…
어떤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은…
덕배와 화이…
둘의 공통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툴다는 것과
무료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도둑과 선생님…
아니 도둑님과 선생
서로 전혀 어울릴 거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친해지는 것을 보면…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느끼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게 그리 어려운 거 같지 않은데…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고
남자와 여자인데…
어울리지 않는 사이일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선생과 도둑이라는 신분 차이라는 고정 관념을 만들어 버리는 우리들…
그런 우리 모습을 비웃는 듯…
사랑에 빠져 버린 덕배와 화이…
그게 만일 풋사랑이 아니라 해도…
둘 사이에 느낀
그 감정의 공유를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까…?
서툴기에 아니 순수하기에 가능했던 두 사람의 느낌들…
솔직히 난 많이 부러웠고 그리웠다…
스무살 시절 묻지 않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들….
마지막에 화이가 덕배가 흘리고 간 스타킹을 쓰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화이는 덕배를 이해하고 싶고 그처럼 되고 싶었나 보다.
덕배가 쓰던 스타킹을 쓰고 그가 바라보던 세상을 보고 싶었나 보다…
누군가가 그립다는 건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독특한 마무리가 가슴에 남는다…
날이 밝아 오고 화이의 집을 나선 덕배…
집을 나서는 모습들조차 덕배가 하면 서툴다…
덕배는 어디로 갔을까…?
일 마치고 쉬러…?
아니면 우리처럼 비정상인데도 정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삶을 살러…?
만일 연극 마무리에 덕배가 리모콘이 달린 tv를 택배로 보내왔다면
정말 우스운 연극이 되었을 텐데…
[덕배는 어디로 갔을까?]하고 관객에게 상상의 나래를 펴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막은 내린다.
연극 내내 나도 결국 서툰 관객이였던 거 같다…
좀 더 크게 웃고 즐기며
배우의 연기에 호응을 해 주었다면 더 재밌었을텐데…
에구구…
나도 이만 떠나야 겠다…
떡.배. 찾으러….
정말, 떡배는 어디로 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