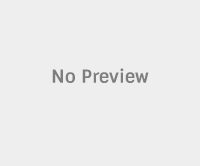사랑을 믿으세여…?
너는 강촌행 열차를 탔다…
아무래도 너에게 4학년의 마지막 한학기가 많은 부담이 된 모양이다.
이제 정말 사회인이 되는 구나….!
살아 남기 위해 살아야 하는 그런 사회인…
제대후 지난 2년 반의 시간들,
눈 깜짝할 새도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 버린 것 같아 후회되는
적잖은 시간들을 꼭 한번 되새기고 싶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종강하지도 않은 수업을 나와
무작정 강촌행 열차를 탔다.
평일이라 한적한 열차칸에서 너는 하염없이 창 밖만 바라보았다.
어느 역이지..?
갑자기 여러명의 사람들이 올라탔다.
무심코 열차 입구를 바라보던 너는 낯설지 않은 눈빛을 발견했다.
어느 긴 머리의 그럴싸한 아가씨…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건지 몰라도
괜히 낯이 익다고,
어디서 뵌적 있죠…?
라고도 한번쯤 말 걸어보고 싶은 그런 여자였다.
.
.
.
모르겠다.
그녀는 그 많은 자릴 냅두고 하필이면 네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띄엄띄엄 앉은 사람들 중에 그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은
아무래도 너밖에 없는 거 같아 네 옆자리 앉았나 보다.
괜시리 넌 애써 무관심한척
옆에 앉은 그녀를 의식 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처럼 창밖을 더 신중하게 응시했다.
솔직히 넌 창밖을 보는게 아니라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어디서 본 눈빛이었지? 왜 그렇게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을까…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왜 이 열차를 탔을까….어디 까지 가는 걸까…?
넌 그 낯익은 눈빛을 안 좋은 머릴 쥐어짜며 생각해 내다
벌써 5년전이 되버린 94년 가을을 생각해 냈다.
선영.. 그녀의 이름이었다.
신기했다.
넌 아직도 네게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이토록 뛰게 하는 사람이
기억 속에 선명히 있다는게 그렇게 신기할 수 없었다.
하긴, 그녀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낸적이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깐….
군 입대를 한 달 여남짓 앞둔 어느 날,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술 한 잔 사겠다며 나오라던 고등학교 동창
선영이와 만나던 날이었다.
혼자 나오기가 심심했던 탓이었을까?
네가 워낙에 심심한 놈인줄 아는 선영이가
데리고 나온 사람은 이름이 똑같은 선영이었다.
하지만 그네도 너보다 더 심심한 사람이었던걸 생각해보면
왜 그때 선영이가 그녀를 데리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너는 곧잘 그녀의 잔에 곧잘 술을 따랐고
그녀는 아무말 없이 그녀의 잔을 받아 마셨다.
둘은 전에 알던 친하게 지내던 사람처럼
술을 따르고 마셨지만 통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분위기는 취했다며 먼저 일어선 그녀를 배웅한다고
나올 때까지 이어졌다.
둘은 아무말도 없이 대학로에서 종로 3가까지 걸었다.
종로 3가까지 갔을 때 둘은 어느 새 손을 잡고 있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냥 그렇게 그렇게 되 버렸던 거였다.
둘은 아무말도 없었다. 그렇다고 어색한 것은 아니였다.
왜 종로 3가까지 걸어갔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고
둘은 끊긴 지하철덕에 심야 좌석을 타야 했다.
그렇게 그 날 운좋게 그녀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중에 군대 가서 얼차려를 받을 때
그 때 생각을 참 많이 했었다.
누가 인연만 되면 모든일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했던가..
그 날 집에 데려다 주던 날 너는 그녀의 입술을 훔쳤다.
마치 능숙한 플레이보이가 그러듯…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경험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갑자기 다가올 줄은 몰랐었다.
그 때 왜 그랬지…?
아마 많이 취했을 거야…
항상 넌 그 때 많이 취해서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 했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한 행동은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전화번호를 묻는 거였다.
그렇게 쉽게 갈쳐주지 않을 아이인데
이유도 묻지 않고 장난도 걸지 않고
너의 동창은 순순히 그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5번의 만남을 가져었다. 그리고 3분의 통화…
그게 전부였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락되질 않았을 뿐더러
왠일인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말을 아끼고 싶은 사람…
너에게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도 신기했다.
혹시 모르겠다.
그녀와 술을 마시다 너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다.
지난 스물한 해라는 적지 않은 시간들이
그녀를 위해 만나기위해 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짧은 한달은 흐르고 군대가기 이틀전 환송회에서
넌 국민학교 6학년 이후로 첨 눈물을 흘렸다.
친구들은 군대 가는게 두렵고
친구들과 떨어져 산다는게 아쉬어 그러는 줄 알았지만
그 자리에 나왔던 너의 동창 선영이는 알고 있는 눈치였다.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있어서 그렇구나?"
"응?…응…
선영이…"
그게 첨이자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 거였다.
생각해 보면 둘은 만나서도 한 번도 서로 이름을 부른적도 없었다…
그 자리에 그녀가 나오지 않았던건 너무나 당연하거였다.
둘은 그런 식으로 둘 사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생각을
추호도 한적이 없었고, 괜히 그러는게
둘 사이를 구차하게 만드는 거 같았다
군대에서 너는 수없이 헤어지는 커플들을 보며
참 잘 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만일 정말 그게 사랑이었다면 싸구려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휴가를 나왔을 때 ‘걔 아마 집에 있을거야. 지금…’하며
선영이가 바뀐 연락처를 주어도 연락하지 않았다.
혹시도 그 때의 아름다운 기억에 행여나
흠집이나 낼까봐…
그렇게 새로운 추억은 시작 됐다…
니 옆에 앉은 여자를 보며 넌 왜 그녀 생각이 났을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던 그녀는 이내 졸기 시작했다.
꾸벅꾸벅 …그리곤 이내 너의 어깨에 기대어 잠을 달랬다.
머리가 참 아름답다. 그녀는 머리가 짧은 숏카트였지만
아마도 머리를 길렀다면 이렇게 아름다웠을거다…….
너무도 닮았다. 하지만 그러기엔 키도 좀 컸다.
강촌이다.
너의 손에 꽉 쥔 열차표와 너의 어깨에 기댄 어떤 여자를
번갈아 보다 넌 그냥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다. 아니 창문을 다시 봤다.
그리고 창문 속에 그녀를 유심히 살핀다…
조금은 바보 같다…
그녀는 졸다가 강촌이라는 안내 방송에 잠시 깨어
낯선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디서 봤을까…전에도 이렇게 편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살며시 손에 쥐고 있는 강촌행 열차표를 꽉 쥔다…
아무래도 그냥 이대로 더 졸고 있어야 할 거 같은 느낌이다.
오랫만에 신은 굽 높은 신발이 더 불편했다.
괜히 심란한 오후…
그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가볍게 그곳을 빠져 나와 강촌행 열차를 탔다.
열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낯설지 않은 향기를 느꼈다…
창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이 눈에 띈다…
이상하게도 옆에 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생각대로 행동했다.
모르겠다…다음역은 어딜까 …
그냥 열차가 가는 대로 놔두는게 낫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다시 눈을 감고
방금전 스쳐지나간 낯설지 않은 향기에서 느낀
96년 아름다웠던 10월을 반추해 본다….
199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