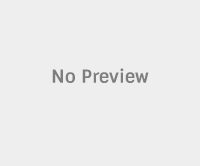사랑이란 무얼까?
흔히들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앞에 무언가 붙어 있는 …사랑, xxx사랑이라고 하지요.
영화를 봐도 로미오와 줄리엣, 타이타닉, 러브스토리등등 젊은 날(주로 20대)의
찰나적(?)사랑이 주류를 이루지요.
어느 한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이, 아니면 눈에 콩깍지가 낀 것처럼 한 상대가
나의 가슴에 불꽃처럼 들어와 자리잡아 버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로 인해 상심하고, 그로 인해 격정에 사로잡히고, 그 것이 전부인양 여기는게
사랑이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 일까요?
나이가 조금 들면, 결혼을 하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열정은 식어져 가는데
그러면 사랑은 사라진 것 일까요?
그의(그녀의) 외모와 단지 아니 웬지 좋아보이고 이끌리는 그 무엇이 전부라고
여겨버리는 것이, 그러한 감정에 충실해 버리는 것이 사랑일까요?
물론 기본적인 base에 그러한 감정마져도 없다면 사랑은 아니겠지요…..
어느 웹사이트에서 한 시인이 쓴 글을 보았읍니다.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고, 또 점점더 삭막해지고 메말라가는 나의 영혼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사랑은 생활이다” ……참 멋대가리 없지요…^^;;
새벽 불륜 목격기…(퍼온글)
오늘은 유난히 손님이 일찍 끊어졌다.
새벽 강은 벌써 두 발짝을 흘러 가고 있었다.
테이블에 꽂아졌던 시집 몇 권 정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싶었다. 마악 등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종이 울리듯 문이 열린다.
삼십대 중반의 남자와 여자, 들어서는 발걸음부터 이상야릇하다.
남자는 밤색 콤비에 외투를 걸쳤고 머리에서 포마이드향이 진하게
날 것만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 있었고,
여자는 검정 숄을 두르고 조금 진한 화장기에다 길어 풀린 듯한
파마 머리가 치장에 신경을 곤두세운 듯한 느낌이었다.
대부분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럴싸한 술과 그럴싸한 안주를 주문한다.
약간 눈빛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감히 단정하였다. 아!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하지만 어쩌랴.
요즘같은 불경기에 손님을 쫓아낼 수는 없는 실정이니 늦은
시간이어도 말 그대로 아름답게 맞이할 뿐이다.
그들의 분위기에 맞게 조명과 음악을 핑크빛 내지는 붉은빛으로
돌려 주었다. 왜 그리 목소리는 큰지 모르겠다. 아니면
나 자신이 그들의 깊은 만남에 귀를 곧추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낮에 써 놓은 시가 거의 다 다듬어질 시간이 되자 그 두 사람의
분위기도 한창 농익어 가는듯 하였다. 여자는 남자에게 착 달라
붙어서 잔을 부딪치고 품 속에 파고 들고, 남자는 그런 여자의
볼을 어루만지고 볼을 부비고 눈뜨고는 쳐다볼 수가 없었다.
차라리 칸막이를 가져다 줄 것을 잘못하였나.
힐끔힐끔 그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들은 두 손을 거의 놓지 않고
있다. 나란히 앉아서 안주를 서로 먹여주기도 하는
그들의 농염한 사랑짓, 사랑짓들…
벌써 시간은 새벽 강을 세 발짝을 넘어섰다.
여자는 약간 취한 듯 목소리가 가끔 끊기다 이어지고,
어쩔 때는 울기도 하면, 남자는 달래기도 하면서 안아주기도
하니 더 이상은 보지 못하겠다. 그냥 밀린 컵이나 씻어야 하겠다
싶어 주방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어쩌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 자기들만의 절절함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죄송하지만 영업 마칠 시간이 되어서
자리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매몰차게 말해야지 하면서
그 좌석에 다가갔다. 순간, “삐리리리리” 휴대전화가 울렸다.
“응, 아빠야. 벌써 일어났어? 쉬하고 얼른 자렴?”
“엄마? 응, 엄마도 아빠랑 같이 있어.”
“엄마 바꿔줄께. 통화 하고 얼른 자 응?”
“엄마야!”
“자다 일어났구나…”
“무섭다고?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께…”
“자기야. 안 되겠어. 집에 그만 들어가자. 효민이가 무섭대…”
“그래, 그만 가자…”
하마터면 들고 갔던 쟁반을 놓아버릴 뻔하였다. 무엇인가에
된통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아찔함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를
몰라서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에 돌아오고 말았다.
“여기, 계산이요…”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너무 늦었죠?”
“이해하세요. 오늘이 아내 생일이거든요. 저희 생각만 했네요.
죄송합니다.”
“…”
낯이 붉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니다,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였다. 그들의 사랑굿을 잠시 색깔을
바꾸어 버린 나의 우매함을 들켜버린 듯한 죄스러움에
아름다운 얼굴들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이 남기고 간 몸짓들과 냄새를 지울 수가 없었다.
가만히 두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다보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한 번 그렇게 살풋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 당신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 한 번
저토록 절절하게 혹은 농염하게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이 있느냐고,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저들처럼
진한 사랑굿을 벌여볼 마음이 있느냐고…
언제부터인가 사랑의 표현이 어색하고, 서먹서먹해져 버린 나는
오늘도 몇 마디 말을 버무린 ‘우리 사랑’ 이라는 시 나부랭이만
남기고 말았다.
아! 불륜처럼 야하고 절절하게 사랑굿을 추던 아름다운 부부여!
우리 사랑
우리 사랑
하늘처럼 높지 않아도
풀꽃 같은 우리님
키 높이면 좋겠네
우리 사랑
햇살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화롯불 같은 우리님
꽃볼이면 좋겠네
우리 사랑
달빛처럼 환하지 않아도
댓잎에 반짝이는
반딧불이면 좋겠네
우리 사랑
바다처럼 깊지 않아도
오직 우리님의 이름만
불렀으면 좋겠네
글 쓰신 분: 김해등 시인
원문 출처: 오 마이 뉴스